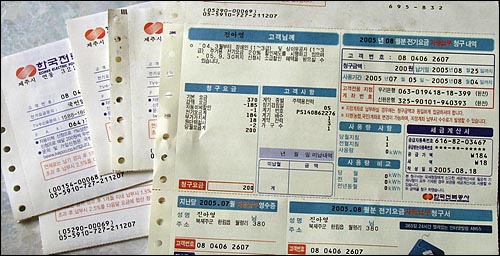|
 |
|
| ▲ 지난해 1월 19일 성이시돌 요양원에 계실 때의 모습. 할머니는 그 해 9월 8일 돌아가셨다. |
|
| ⓒ 고성만 |
|
 |
|
| ▲ '4·3 할머니'라고 불리웠던 진 할머니의 집 앞에는 마치 '분신'이라도 된 듯 한 송이의 노란 선인장 꽃이 피어 있다. |
|
| ⓒ 양김진웅 |
|
 |
 |
|
| ▲ '제발 죽기전에 온전한 턱을 갖고 싶다'던 진아영 할머니는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방한켠에 놓인 이 사진은 젊은때의 사진에 4.3 유족들이 진 할머니의 뜻을 이어 잃어버린 턱을 되찾아준 것이다. |
|
| ⓒ 양김진웅 | 4·3의 고통을 온 몸에 새긴 채 가신 무명천 할머니를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이맘때 하얀 무명천으로 턱을 동여맨 채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한 할머니가 있었다. 바로 남녘 땅 끝 제주도에서 돌아가신 진아영 할머니(당시 90세·한림읍 월령리).
진 할머니는 1948년 제주도 4·3 사건 당시 고향집(한경면 판포리) 앞에서 누가 쏘았는지도 모르는 총에 맞아 턱을 잃어 평생을 하얀 무명천으로 턱을 감싼 채 살아와 '무명천 할머니'라고 불렸다.
지난 8일은 진 할머니가 한(恨) 많은 세상을 떠난 지 1주년이 된 날이었다. 하지만 그를 기억해 주는 이들은 없었다. 여느 할머니였다면 '소상'이니, '야제'니 시끌벅적할만도 했건만 누구하나 할머니의 죽음을 기억해내는 이는 없었다.
며칠 전 할머니의 임종을 책임졌던 한림읍 성이시돌 요양원에서 할머니가 묻힌 봉분에 간단한 벌초를 했을 뿐, 그가 살았던 한림읍 월령리 집에는 반쯤 덮인 담쟁이덩굴과 잡초만이 쓸쓸히 지키고 있다.
지난해 9월 진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4·3 관계자와 많은 지인들은 물론 모든 언론매체까지 나서 할머니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올해는 달랐다. 평소 할머니를 찾았던 몇몇 지인들이 이날 1주기를 맞아 고향을 등지고 평생을 살았던 월령리 집을 청소하고 할머니가 잠든 성이시돌 공동묘지를 찾아 절을 올린 게 전부였다.
 |
|
| ▲ 지인들이 8일 오후 진아영 할머니 묘를 찾아 간단한 성묘를 지냈다. |
|
| ⓒ 양김진웅 |
|
 |
|
| ▲ 진 할머니가 잠들어 있는 성이시돌 공동묘지 내 봉분. 평생 '4·3 무명천 할머니'라는 이름이 따라다녔다. |
|
| ⓒ 양김진웅 |
|
진 할머니는 지난해 눈을 감는 그날까지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다. 1949년 1월 군·경찰토벌대에 의해 턱을 잃은 할머니는 그 후 남편까지 잃고 말았다. 4·3으로 인한 후유장애로 평생 링거와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했던 할머니는 이후 심장질환과 골다공증 등 많은 노환에까지 시달렸다.
결국 홀로 지내던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자 이시돌 요양원에서 2년 반 동안 요양을 받다 임종날 오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을 감을 때에도 할머니는 누구에게도, 원망도 탓도 하지 않았다.
세상이 바뀌면서 4·3특별법이 제정되고 다시 미흡한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야단하고 있지만 정작 그 빛을 봐야할 할머니는 이승에 없었다.
1주기를 맞아 이날 할머니의 처소 정리를 제안한 고성만(27·제주4·3연구소 연구원)씨는 "아픔과 고통에 아랑곳 없이 할머니는 '4·3 할머니'로 상징돼 많은 이들로 부터 시선을 받았지만 정작 할머니의 숭고한 죽음을 기억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평소 할머니를 찾아 생전의 모습을 담아 두었던 그는 "할머니가 살았던 이곳은 무엇보다 값진 4·3 흔적지의 하나"라며 "지인들을 중심으로 십시일반의 정성을 모아 할머니의 집을 보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 네티즌이 '무명천 할머니 추모카페(cafe.daum.net/jeju43sad)를 개설했지만 여기에도 찾아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
|
| ▲ 진아영 할머니가 살았던 한림읍 월령리 집. 담쟁이덩굴이 뒤덮고 있다. |
|
| ⓒ 양김진웅 |
|
 |
|
| ▲ 진 할머니가 살았던 방안. |
|
| ⓒ 양김진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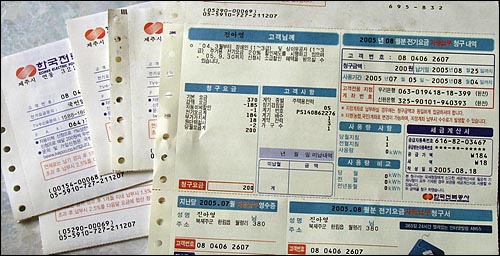 |
|
| ▲ 주인 없이 쌓여간 전기요금 고지서. 요금액은 200원이라 적혀 있다. |
|
| ⓒ 양김진웅 |
|
무명천 할머니 - 월령리 진아영
허영선 시인
한 여자가 울담 아래 쪼그려 있네
손바닥 선인장처럼 앉아 있네
희디 흰 무명천 턱을 싸맨 채
울음이 소리가 되고 소리가 울음이 되는
그녀, 끅끅 막힌 목젖의 음운 나는 알 수 없네
가슴뼈로 후둑이는 그녀의 울음 난 알 수 없네
무자년 그날, 살려고 후다닥 내달린 밭담 안에서
누가 날렸는지 모를
날카로운 한발에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턱
당해보지 않은 나는 알 수가 없네
그 고통 속에 허구한 밤 뒤채이는
어둠을 본 적 없는 나는 알 수 없네
링거를 맞지 않고는 잠들 수 없는
그녀 몸의 소리를
모든 말은 부호처럼 날아가 비명횡사하고
모든 꿈은 먼 바다로 가 꽃히고
어둠이 깊을수록 통증은 깊어지네
홀로 헛것들과 싸우며 새벽을 기다리던
그래 본 적 없는 나는
그 깊은 고통을 진정 알 길 없네
그녀 딛는 곳마다 헛딛는 말들을 할 수 있다고
바다 새가 꾸륵대고 있네
지금 대명천지 훌훌 자물쇠 벗기는
베롱한 세상
한 세상 왔다지만
꽁꽁 자물쇠 채운 문전에서
한 여자가 슬픈 눈 비린 저녁놀에 얼굴 묻네
오늘도 희디흰 무명천 받치고
울담 아래 앉아 있네
한 여자가 | |